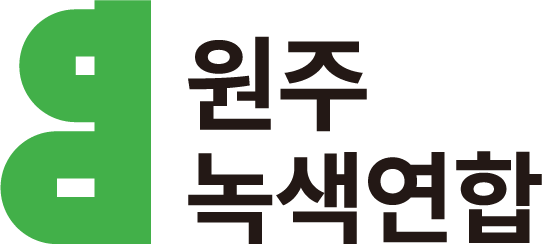나무와 묘지 최재석 한라대 건축학과 교수 원주녹색연합 공동대표 1994년 9월 한 일간지 칼럼에서 ‘나무墓地’라는 생소한 제목에 끌려 읽어보고 스크랩을 해 논 적이 있다. 일가(一家)의 숲을 만들어 놓고 그 혈육이 죽으면 화장을 하여 뼛가루를 숲 속 나무들의 밑거름이 되게 한다는 기발한 독일의 조상림(祖上林) 장묘문화와 화장한 유해의 분말을 특정나무의 뿌리에 주입시켜 묘지를 조성한다는 스위스의 나무묘지에 대한 소개였다. 나무묘지, 즉 수목장(樹木葬)은 1999년 스위스인에 의해 창안되어 현재 독일, 영국, 일본 등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고, 2000년 9월에는 ‘독일수목장연합회’가 창설되어 독일 곳곳에 수목장림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나무묘지, 즉 수목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현재 우리나라 묘지면적은 약 3억평으로 서울시 면적의 1.6배에 해당되고, 매년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해당하는 180만평의 산림이 묘지로 잠식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사는 주위를 둘러보면 명당이라는 곳은 사자(死者)가 차지하고, 가족묘를 꾸민 곳은 산허리가 잘려나가고 능선의 모양이 울퉁불퉁 변형됐을 정도로 흉한 곳이 많다. 또한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묘지를 한곳으로 모으거나 가족의 유골을 한곳으로 모으기 위한 납골당과 납골묘가 대안으로 떠오르지만, 이것마저 지나치게 보여주기 위한 치장으로 치우쳐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기존의 묘지형태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이 또한 자연환경 훼손의 결과로 얻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나무묘지도 여기에 쓰일 나무가 자연상태 그대로이거나 새로이 이식한 묘목이어야지, 가족림을 꾸민답시고 다른 지역의 품질좋은 소나무 등을 이식한다면 또 다른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묘지조성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가족단위로 나무 한그루를 키우거나 나무가 없는 터에 묘목을 심어 조림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원주는 천예의 좋은 자연환경을 갖고 있으나, 도심 주변은 난개발과 묏자리로 듬성듬성 패인 모습이 마치 폭격을 맞은 듯 흉한 모습을 보이고, 특히 장지(葬地)나 이장(移葬)은 물론이고 성묘(省墓) 때도, 묘지의 남향을 가린다고 나무를 모조리 베어 버리는 풍속은 아직도 곳곳에서 성행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정해진 묘지 면적보다 더 많은 산림이 훼손되는 셈이다. 이것은 조상의 묘지에 그늘이 지면 후손에게 영향을 준다는 관습적 인식이 더 큰 문제이다. 또한 묘지의 잔디가 잘 자라기 위해선 햇볕도 잘 들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금년이 가기 전에 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겠다. 훗날 이곳을 방문한 후손들이 ‘이 나무가 너희 할아버지란다’는 말에 후후손(後後孫)들이 ‘에! 나무가 무슨 할아버지야’라고 의아해 하면서도, 여름에는 나무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겨울에는 눈꽃송이 만발한 모습을 보면서 자라게 될 것이다.(원주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