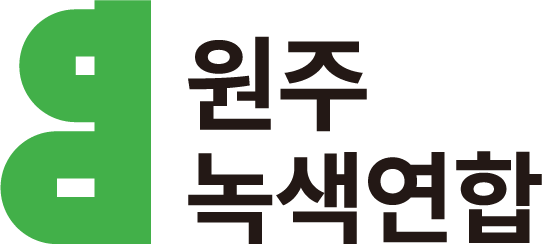바보의 벽(壁) 최재석 한라대 교수/원주녹색연합 공동대표 새천년(New Millenium)을 맞이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다. 당시 모 신문사에서 새로운 21세기가 도래하는 시점에, 앞으로 국민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관 조사를 하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동체의식의 필요성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이는 최하위의 개인주의(1.8%)에 비해 무려 14배에 달한다. 사전적으로 공동체란 ‘생활이나 운명을 같이하는 조직체’라 정의된다. 실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공동체’ 라는 말이나 이와 의미가 상통하는 많은 언어를 볼 수 있다. ‘내 엄마’, ‘내 가족’ 이라 하지 않고, ‘우리 엄마’, ‘우리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도 한 예이다. 실제 가족이란 하나의 혈연공동체로, 타(他)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나(自)보다는 우리(共)라는 공동체적 단위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교수신문에서는 2004년도의 대표적인 사자성어(四字成語)로 ‘당동벌이(黨同伐異)’를 들고 있다. 이는 ‘무리를 지어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는 의미이다. 나(自)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타(他)를 이유 없이 배타하는 집단적인 속성(俗性)을 말한다. 이는 ‘우리’라는 객관적 공동성보다는 ‘나’라는 집단적 개인주의가 더 지배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집단 내에서는 어떤 일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측면보다는 ‘좋은 것이 좋다’라든가 ‘봐주기 식’으로 흐르기 쉽다. 요로 다케시(養老孟司)는 『바보의 벽(壁)』이라는 저서에서 ‘자신이 알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차단해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바보의 벽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예를 들면 길에 작은 벌레가 기어가는 것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동전이라도 하나 떨어져 있으면 금세 발길을 멈추게 되는 행위의 차이를 말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우리는 ‘개인(個人)은 타인(他人)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철학적 의미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유태인 심리학자 플랭클도 ‘자기실현’, 즉 자신이 무언가를 실현하는 장(場)은 외부에 존재한다고 역설하면서, “인생의 의미는 자신만의 완결이 아니라 늘 주변 사람 및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장은 공동체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어떤 사회, 어떤 공동체가 바람직하며 우리는 앞으로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얻을 수도 있다. 원주가 이상적인 도시로 가고자 하는 바람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원주가 갖는 고유한 전통성은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원주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공통적 이해’ 를 바탕으로 거듭 나야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더 이상 제도, 지역, 연고, 혈연, 학연, 그리고 개인주의 등에 얽매이는 일원론적 ‘바보의 벽(壁)’을 쌓지 말자. 철학자 칸트는 ‘모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판단력의 기준으로 삼았다. 인간생활이든 도시공간이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초월론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