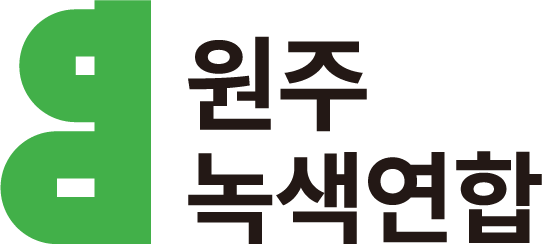| 국가환경계획 달성률 39% 지난 10년간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환경계획(환경비전21)이 목표 대비 40%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관련 예산 확보가 미흡했던 데다, 목표치 자체가 현실성을 결여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수립하는 환경계획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하려면 연도별 이행현황 평가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 부설 시민환경연구소(소장 장재연 아주대 교수)는 8일 정부가 최상위 국가환경계획인 ‘환경비전21’(1996∼2005년)에 담은 목표치 가운데 69개 정량지표 항목을 대상으로 달성도를 분석한 결과, 27개 항목(39.1%)만 달성됐거나 올해 말까지 달성가능한 것으로 집계됐다. 37개 항목(53.6%)은 당초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정부부처가 진척 현황을 파악하지 않아 통계치를 확인하기 불가능했던 경우도 5개 항목(7.3%)에 달했다. 미세먼지의 경우 10년 전,㎥당 6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1g) 이하로 목표를 세웠으나 전국 60개 시·군 가운데 23개 시·군이 목표치를 초과했다. 전국 194개 하천구간의 수질기준 달성률은 95%가 목표였으나 실제 달성률은 36.3%에 불과했으며, 올해 말 음용수 수질기준 항목을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120개로 늘리겠다던 목표도 결국 ‘구두선’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폐기물재활용률은 당초 목표치(25%)를 크게 웃돈 45.2%였으며,1인당 음식쓰레기 발생량도 하루 300g이 목표였으나 240g으로 줄어드는 성과를 올렸다. 시민환경연구소는 이처럼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현실성을 결여한 과도한 목표 설정 ▲예산·세부추진전략 등 정책수단 확보 결여 ▲계획 달성 여부에 대한 중간점검의 미비 등을 꼽았다. [출처] 2005-12-09 서울신문 박은호 오존층 회복 생각보다 오래 걸릴것
남극 대륙 상공의 오존층 구멍이 메워지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는 자연재해 최악의 해
미국을 덮친 위력적인 카트리나와 윌마, 유럽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유례없이 강력한 허리케인 등으로 올해는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송파 습지에 ‘에코 파크’ 조성
송파구 방이동 생태계보전지역 20여 년간 도심 습지로 남아 있던 서울 송파구 방이동 440-15 일대 생태계보전지역 1만6800여 평(5만5000m²)이 도심 속 ‘에코 파크(eco-park)’로 태어난다.
성내천과 감이천 사이의 삼각형 습지 지역인 이 지역은 과거 한강 범람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모래섬의 일부. 1970년대 토사채취로 인공적인 웅덩이가 만들어진 뒤 지하수가 유입되면서 습지로 형성됐으며 1980년대 이 일대에 올림픽공원과 선수촌 아파트가 건설됐지만 이 지역만은 개발에서 제외됐다.
[출처] 2005-12-7 동아일보 민통선 이북 개발제한 계속돼야”
비무장지대(DMZ)와 민통선 주변 주민들의 73%가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주변에서 자연생태 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 조처가 계속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북한 평화체제가 정착돼 앞으로 이 지역이 개발되더라도 환경 친화적인 생태도시로 조성되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달 23~24일 한길리서치에 맡겨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주변 주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5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민통선 주변 주민들은 전체의 85%가 민통선 일대가 다른 지역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 낙후됐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처럼 무조건적 개발보다는 생태환경 보전에 깊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한 사이에 군사적 대치상황이 끝났을 때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일대의 바람직한 개발방향을 물은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개발과 보전이 명확히 구분된 친환경 생태도시지역 조성이 48%로 가장 많았고, 남북한 교류 중심도시로의 개발(29%), 평화의 상징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보전(15%), 6·25 전쟁 이전처럼 농업 중심의 개발(5%) 등의 차례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민통선 일대 주민들의 82%가 비무장지대 및 민통선 지역의 보전과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2005-12-5 한겨레신문 |